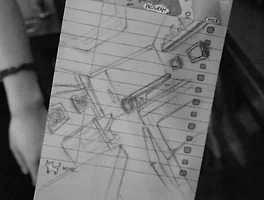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것은 네 살.
“엄마, 저기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
뜰에서 놀다 평소처럼 가벼운 기분으로 조잘거린 한마디에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 그래? 엄마 눈에는 안 보이는데?”
가볍고 무게 없는 대답은 그가 기대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 이전에도 몇 번인가 어머니에게 ‘그것’에 대하여 말한 적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흘려들을 뿐, 결코 분명히 대답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단 한번도.
가끔 그들과 시선이 마주칠 때가 있다. 물론, 그것들 모두에게 ‘눈’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노라면 숨을 죽이고 조용히 주시하는 기척이 전해져 온다. 검고 서늘한 의식은 언제나 서서히 다가와 주위를 맴돈다. 그리고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서서히 체온을 빨아들인다. 사로잡힌 손과 발은 조금씩 무거워지며, 이윽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진다. 냉기는 밖에서부터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안쪽에서부터 스멀대며 퍼져 나가는 소름끼치는 느낌이 전신을 엄습한다.
그럴 때면 그는 온 힘을 기울여 눈을 감고 몸을 웅크렸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마치 주문을 외우듯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며.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단지 그렇게 믿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어째서? 사람들은 저런 이상한 것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걸까. 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 버리는 걸까.
그런 의문은 어린 가슴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려 깊이깊이 파고들어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뿌리는 너무나 깊어져 더 이상 그 안에만 담아 두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렸다. 그래서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알고 있으면서도 상냥한 빛을 띤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저기, 엄마. 엄마는 저 사람, 안 보여? 저기 저 얼굴이 없는 빨간 옷을 입은 아저씨 말이야.”
라고 말해 버리고야 만 것이다. 그러나,
“어, 어머, 얘는, 또 이상한 소리를….”
모친의 시선에 상냥함 대신에 공포라는 감정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서야 그는 자신이 해선 안 되는 말을 한 것이라는 깨달았다.
“그만 하렴. 이웃집에서 들으면 정말로 혼날 게 분명해요, 율아.”
또한, 그녀는 그가 보는 것을 결코 받아들려 하지 않으리란 것을,
“이 아이는 어째서 자꾸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걸까….”
스치듯 흘려 말한 그 잔인한 말이 언제까지나 가슴에 새겨지게 될 것을 알았다면, 그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 설혹 영원히 홀로 그 두려움과 싸우게 되었을지라도.
이웃집의 아저씨가 교통사고로 죽은 지 일 년이 넘었다는 것을 안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 장을 보러 나왔다가 동네 아줌마들이 수근 거리는 소리를 들은 뒤였다.
사고 현장은 끔찍했다고 한다. 과속으로 달려오던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한 승용차는 휴지조각처럼 구겨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에 물들어 옷은 붉은 빛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이 보고 있던 ‘그것’들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닌 이형(異形)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글쟁이들의 글 이야기]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