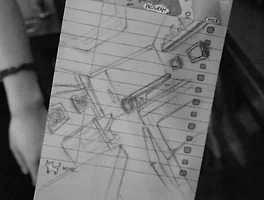운율은 다시 교사용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이 나른히 하얀 도화지위로 쏟아진다. 얇은 유리창을 두드리는 바람은 아직 서늘한 감이 남아있지만, 교실 안까지 들어오지는 못한다. 금싸라기 같은 볕만이 창가를 따스하게 데울뿐.
운율은 무의식중에 안경을 쓰다듬었다. 한기를 막아주는 창문의 모습과 그의 ‘볼 수 있는’ 눈을 봉(封)하는 안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비슷했다.
돌이켜 보니 안경을 쓰기 시작한지 벌써 20여년이나 흘렀다.
뇌리에 다정한 한마디가 떠올랐다.
‘보고 싶지 않다면 보지 않아도 된단다.’
그것은 오래전 세상을 뜬 조모가 그에게 해주었던 말.
어린 시절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보는 것으로 인해 고통 받던 때. 그의 부모는 이형(異形)을 보았노라는 아들의 고백을 단지 철없는 어린아이의 거짓말로만 대했었다.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자 그는 다시는 누구의 이해도 구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맹세를 했다. 그리고 홀로 두려움과 고독을 피해 이불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에게 조모는 그렇게 말해주었다.
‘그렇게 괴롭다면 차라리 눈을 가리려무나.’
주름지고 부드러운 손이 이불속으로 파고 들어와 소년의 눈을 덮었다. 마치 유리 세공품이라도 만지는 듯 상냥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순간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히 가라앉았던 것을 그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마침내 운율이 안정을 되찾자 조모는 어디선가 긴 천을 가져와 그의 눈을 가렸다. 그리고 따스하게 그를 위로했다.
‘보이지 않으면 저런 것들은 금세 잊혀 진단다. 그러니 저들에 대하여 잊을 때까지 눈을 가리고 있는 거야.’
그 목소리는 쓸쓸한 기분이 들 정도로 상냥해서 어린 운율은 어떤 거리낌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검고 두꺼운 천이었다. 이런 것으로 정말 저것들이 사라지는 건지 조금 의심스러웠던 그는 일부러 앞을 보려 눈을 크게 떠보았다. 그러나 빛은 그 검은 장막을 결코 통과 하지 못했다. 비로소 그는 안심했다.
보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자 조모는 천을 좀 더 얇은 것으로 바꾸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천은 차츰 밝은 색으로, 얇고 부드러운 재질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얇고 얇은 베일 자락에서 투명한 유리알까지 이르렀다.
투명한 유리알 속의 눈동자는 흡족하게 빛났다. 이미 그것은 눈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조심스럽게 안경을 벗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견딜 수 없이 기뻤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조모를 찾았다.
그리고 그녀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말했다.
‘할머니는, 할머니는 어디에 있어?’
어머니는 천천히 부드럽고 상냥하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불안함을 애써 숨긴 다정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 율아. 할머니는 율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그러니까 율이는 할머니는 뵐 수 없어.’
그 순간,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믿고 있던 어둠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는 어머니의 뒤편,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장식장 사이, 작은 발로 디디고 선 마루의 나무 틈새.
그것들은 어디에서도 도사리고 있었다.
‘보고 싶지 않다면 보지 않아도 된단다.’
다정하게 울리던 그 목소리마저 어둠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던가. 신음 소리가 흘러나올 것 같아 입을 틀어막는다. 생각해보면 그는 조모의 손의 형태나 감촉은 기억해도 온기만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심장이 욱신 거린다.
그는 미친 듯이 방안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모친이 무엇인가 소리를 친 듯 했지만 그는 전혀 듣지 못했다. 그녀의 가녀린 목소리 따윈 끊임 없이 소근 거리는 그것 들의 목소리에 파뭍혀 닿지 않았음으로.
그는 손등을 피가 나올것 처럼 강하게 깨물었다. 그렇지 않으며 울고 소리지르며 미칠때까지 난동을 부리게 될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치 경기라도 잃으킬듯이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해 문에 등을 대고 기대어 있있던 그의 시선에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들어왔다. 얇은 검은색 태. 매끄러운 한쌍의 렌즈.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던 안경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는 천천히 안경을 썼다.
차가운 감촉이 눈가를 뒤덮었다.
그리고 세상이 고요히 가라앉았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글쟁이들의 글 이야기]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